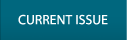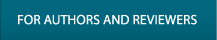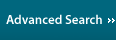서 론
수술 중 과민반응(perioperative hypersensitivity reaction)은 마취 중 사용하는 여러 약물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, 흔하지는 않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마취과 의사는 발생 가능한 약물에 대한 이해,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 수술 중 사용하는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은 신경근이완제, 특히 스테로이드형 신경근이완제인 rocuronium bromide에 의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. 그 외에도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와 라텍스, 피부소독제인 chlorhexidine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[1].
약물 과민반응에 대한 가장 흔한 임상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혈관부종이 있고, 호흡곤란, 두통과 어지러움, 오심 및 구토와 설사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, 심각한 증상으로는 저혈압과 빈맥 또는 서맥 등이 발생할 수 있다[2]. 그러나 전신마취 시에는 두통이나 호흡곤란 등을 환자가 호소할 수 없으므로 두드러기나 기관지 연축 시 최대 흡기압(peak inspiratory pressure)의 상승, 저혈압과 빈맥 등의 증상으로 약물 과민반응을 의심할 수 있다. 저자들은 rocuronium bromide를 투여한 20분 후 두드러기나 기관지 연축 등의 증상없이 저혈압과 빈맥만이 동반된 아나필락시스(anaphylaxis)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.
증 례
키 173 cm, 몸무게 78 kg인 65세 남자 환자가 전립선 암 진단으로 복강경하 근치전립선절제술을 시행받기 위해 내원하였다. 환자는 고혈압으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(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)인 olmesartan medoxomil을 복용 중이었고,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methylprednisolone 3 mg을 복용 중이었으며, amoxicillin 투여 후 두드러기, 발진, 가려움이 발생한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었다.
전신마취를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마취 전 처치로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.2 mg을 근주하였고, 수술 중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당일 아침 olmesartan medoxomil의 복용을 중단하였다. 수술실 도착 후 심전도, 심박수, 비침습적 혈압, 맥박산소포화도를 감시하였으며, 마취 유도 직전 활력징후는 혈압 165/72 mm Hg, 심박수 66회/분, 맥박 산소포화도 98%였다. 마취 유도를 위하여 lidocaine 40 mg 투약 후 1% propofol 160 mg (2 mg/kg)을 정주하였다. 환자의 의식소실을 확인 후 Sevoflurane 3 vol%와 O2 6 L/min을 투여하면서 rocuronium bromide (Hanlim Pharm Co. Ltd., Yongin, Korea) 50 mg (0.6 mg/kg)을 서서히 정주하였다. Rocuronium 정주 약 3분 후 비위관 삽입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며, 1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의 sevoflurane과 FiO2 0.5로 O2와 air를 투여하며 마취를 유지하였다. 이후 침습적 동맥압 감시를 위하여 왼쪽 요골동맥에 modified Allen’s test를 한 후 동맥관을 삽입하였으며, 동맥관 삽입 직후 측정된 침습적 동맥압은 135/62 mm Hg, 심박수 76회/분이었다. 이후 대량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이었으므로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2% chlorhexidine으로 피부소독을 실시한 후 중심정맥 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, 중심정맥관 고정을 위하여, 2% chlorhexidine으로 주변 피부를 한 번 더 소독한 후 멸균 투명필름 드레싱(3M Tegaderm)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.
Rocuronium 투여 20분 후 피부소독을 완료한 직후 맥박수가 110회/분으로 상승하면서 침습적 동맥압의 수축기혈압이 74 mm Hg로 측정되어 phenylephrine 100 μg과 ephedrine 5 mg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. 이후 phenylephrine 200 μg을 두 차례 더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, 이때 비침습적 혈압은 58/31 mm Hg, 침습적 동맥혈압은 35/22 mm Hg, 맥박수는 80회/분으로 측정되어 epinephrine 0.1 mg을 2차례 투여하였다. 그러나 epinephrine에 반응하지 않고 침습적 동맥압파가 거의 일직선으로 관찰되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3분 정도의 심폐소생술을 실시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. 이때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, 인공호흡기에서 측정된 최대 흡기압은 17–20 cmH2O 정도로 기관지 연축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. 이 후 epinephrine 0.3 mg 투여 후에도 비침습적 혈압 72/41 mm Hg, 맥박수 91회/분으로 측정되어 dopamine 200 mg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10 μg/kg/min의 속도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. 수술 중단을 결정한 후 sugammadex 150 mg(약 2 mg/kg)을 투여하여 rocuronium의 효과를 역전시킨 후 환자의 일회 호흡량이 충분히 회복되고, 의식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발관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. 수술 당일 저녁 생체징후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며, 환자는 다음날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다.
수술 중 발생한 저혈압의 원인으로 methylprednisolone 복용 중단에 의한 부신기능저하증(adrenal insufficiency)을 의심하여 수술 당일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ACTH stimulation test는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, 수술 중 저혈압 시 시행한 경식도 심초음파, 수술 후 경흉부 심초음파에서도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. 중환자실 입실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림프구 증가소견 외에는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.
3일 후 중심정맥 삽관을 위해 소독을 한 목 부위에 홍반, 반점, 구진이 발생하였으며,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(allergic contact dermatitis) 진단하에 methylprednisolone 용량 증량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. 환자가 항생제에 알레르기를 보인 과거력이 있었던 것과 중심정맥 삽관 부위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수술 중 저혈압은 수술 중 과민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 원인 감별을 위하여 30일 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알레르기 원인검사를 시행하였다. 본 환자에서 수술 중 과민반응을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약물은 propofol, rocuronium, latex였으며, 본원에서 사용되는 다른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cisatracurium과 succinylcholine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였다. Latex에 대한 mast cell immunoglobulin E (IgE)검사는 정상이었고 propofol, rocuronium, cisatracurium, succinylcholine에 대한 피부단자검사(skin prick test)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. 하지만 추가로 실시한 피내 반응검사(intradermal test)에서 1:200으로 희석된 rocuronium에는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1:10으로 희석된 rocuronium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환자는 마취유도를 위해 투여한 rocuronium에 의한 약물 과민반응으로 심한 저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 또한 환자는 1:100으로 희석된 cisatracurium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여 benzylisoquinoline 계열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cisatracurium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.
이 증례는 임상시험이 아니므로 윤리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으며, 이 보고서의 출판을 위해 환자로부터 서면동의(informed consent)를 얻었다.
고 찰
수술 중 과민반응은 대략 1/353–18,600 정도의 다양한 유병률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, 발생이 흔하지는 않으나 발생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술 중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률은 대략 4%–4.76%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[1].
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은 크게 면역반응에 의한 것과 위알레르기(pseudoallergy)에 의한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. 면역반응에 의한 것은 발생시간이나 양상, 기전에 의해 4가지 타입으로 분류되며, type I 반응은 specific IgE와 mast cell, basophil을 매개로 하여 투여 수분에서 한 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며, 수술 중 사용되는 항생제,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의한 과민반응의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. Type IV 반응의 경우 대개 3–4일 뒤에 발생하며, T-cell을 매개로 하여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(allergic contact dermatitis)의 증상을 일으킨다[3]. 위알레르기는 비면역성 과민반응이라고 불리며, 그 증상이 면역반응에 의한 과민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Mas-related G-protein coupled receptor member X2 수용체가 IgE가 관여하지 않고, 직접 mast cell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[4]. 이를 유발하는 약물로는 vancomycin, nonsteroidal anti-inflammatory drugs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가 있다.
본 증례에서 과민반응을 유발한 약물로 추정되는 rocuronium과 같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경우 면역성, 비면역성 과민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, 비면역성의 경우 피부 단자검사와 같은 면역반응검사에서는 음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본 환자는 피부 단자검사는 음성을 나타냈으나, 피내 반응검사에서 1:10으로 희석된 rocuronium에 양성 반응을 보여 수술 중 나타난 과민반응이 rocuronium에 의한 반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
최근 수술 중 중심정맥관 삽관을 위한 소독제로 2% chlorhexidine과 도뇨관 삽입 시 소독 및 윤활을 위해 0.25% chlorhexidine gluconate를 포함한 윤활제(Instillagel)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chlorhexidine에 대한 과민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반복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증례들이 보고되었다[5,6]. 본 환자의 수술 중 심한 저혈압을 동반한 과민반응은 chlorhexidine 사용 직후 발생하였으므로 chlorhexidine 역시 원인약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. 또한 chlorhexidine을 사용하였던 피부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것 역시 이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.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chlorhexidine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는 이뤄지지 않아 그 연관성이 증명되지는 못하였기에 추후 chlorhexidine의 재사용 전에 이에 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임상양상은 대개 약물투여 수분 내에서 최대 한 시간 내에 발생하며,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이 환자의 90%에서 나타날 정도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나,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두드러기나 발진 등의 피부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[2]. 그 외 호흡곤란과 기관지 연축이 60%, 어지러움과 실신이 29%의 환자에서 나타나며, 20%의 환자에서 저혈압이 나타나고, 빈맥 또는 서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[2]. 본 증례의 경우 약물투여 후 중환자실로 퇴실하기까지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피부증상은 전혀 없었고,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나 산소포화도의 감소와 같이 기관지 연축이 의심될 만한 증상도 없었으며, rocuronium 투여 20분 후에 약간의 빈맥이 먼저 발생한 후 심한 저혈압이 발생하여 초기에 약물 과민반응에 의한 저혈압을 의심하기 어려웠다. 본 환자에서 피부증상과 호흡곤란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anti-inflammatory drug인 methylprednisolone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. 본 증례에서는 전형적인 증상의 부재로 인해 증상 발현 30분에서 6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는 약물 과민반응 진단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인 혈장 히스타민과 트립타제, rocuronium 특이 IgE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[7].
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치료는 저혈압 치료를 위한 혈관 내 용적의 보충, 저산소증 등의 교정과 원인물질 투여 중단이 주가 된다. 100% 산소와 수액, epinephrine을 투여하고 지연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hydrocortisone을 투여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[8]. 또한 마취 중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약제를 피하는 것으로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의심되는 약물에 대해 사용 전에 과민반응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[9]. 본 증례의 환자에서는 amoxicillin에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었으나, 수술 전 다른 약물에 관한 과민반응에 관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. 시행이 되었다면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조기에 알아내어 증례와 같은 수술 중 과민반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.
저자들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한 환자에서 과민반응의 전형적인 증상 없이 심한 저혈압과 빈맥의 비특이적인 증상만을 나타낸 수술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 이런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인지 및 예방,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관한 임상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